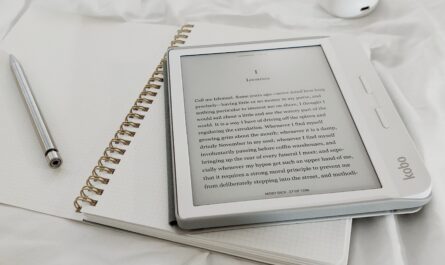보편적인 IT 시장의 외주 구조
대기업에서는 보통 자회사를 설립해 1차 협력사로 등록하고 자회사에 1차 협력사로 등록한 업체에 외주를 주게 된다. 사실 자회사의 1차 협력사이니 2차라고 해도 무방하다.
자회사에 1차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사원수 매출 등을 보기 때문에 선점하는 SI 나 웹에이전시 들이 주를 이룬다.
IT 계열사가 없는 대기업에서 SI 업체나 에이전시에 직접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으나 앞서 설명한 대기업의 자회사를 통해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경우는 구조가 더 복잡해진다. ( 1번 케이스 )
- A 기업(고객사) > B 기업의 자회사(IT 기업) > B 기업의 1차 협력사 > 대형 SI 또는 에이전시 > 이하 생략
- B 기업 > B 기업의 자회사 > B 기업의 1차 협력사 > 대형 SI 또는 에이전시 > 이하 생략
- C 기업(고객사) > 대형 SI 또는 에이전시 > 이하 생략
IT 생태계의 대형 SI 업체들은 주로 대기업 임직원 출신인 경우가 많다. 한국 비즈니스 환경은 여전히 학연, 지연, 혈연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 많이 개선되고 공정거래를 유도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기업에서는 자회사에 외주를 위탁하고 자회사는 기존 SI 기업들에게 업무를 내린다.
과거 대기업 임직원 출신은 실무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엔지니어가 퇴사 후 사업체를 차리기 보다는 외주를 담당을 했던 사업 관리자가 사업체를 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주로 받은 프로젝트 성과를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성과 보다는 담당자와 친밀감을 유지하고 술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특히, 공공기관 시스템을 보면 기가 찬 경우를 많이 본다. UI 는 그럴싸한데 구조적으로 잘못된 시스템도 많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데도 방치되거나 크로즈브라우징을 고려하지 못해 사용자가 가장 많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조차도 버튼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뿐만아니라 FHD 노트북에서 조차도 팝업 닫기 버튼이 화면 밖에 있으며 포커싱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팝업을 띠우는 기관 사이트도 있다.
이러한 불편함은 IT 분야 종사자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다. 최근 재미있게 읽고 있는 세이노의 가르침에 개발자를 욕하는 내용을 보면 일반인들도 IT 현실을 정확히 파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욕 좀 하자. 신용카드로 인터넷에서 결제할 때 카드번호를 프로그래머들에게 어떤 카드는 16개 번호를 계속 입력하면 4개씩 자동으로 뒤 입력하는 경우, 어떤 카드는 4개 입력하고 나서 탭을 놀러야 넘어간다. 계좌이체를 위해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할 때 어떤 은행의 프로그램에서는 대문자 키가 눌려져 있는지를 보여 주지만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한다는 메시지만을 보여 주거나 아무런 메시지 조차 없는 경우들이 더 많다. 이런 사례들은 하나둘이 아니다. 즉 닭대가리 프로그래머들이 많다는 말이다. 어느 유명 백화점과 마트의 쇼핑 앱을 아내 때문에 종종 보게 되는데 정말 누가 만든 것이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사장은 PT나 잘하는 놈인지 쌍욕이 나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코딩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 어중이떠중이 다 덤벼드는 바람에 닭대가리 프로그래머들이 자기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채 월급을 받아 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공공기관에서 외부 회사에 맡겨서 만든 프로그램들은 절반 이상 엉성한 경 우가 많지만(이련 경우 그 용역 회사의 사장은 집대하느라 바쁘다) 정작 그 기관에서는 외부 용역 콜센터가 있어서 잘 돌아가는 줄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 내 선입관이다”
세이노의 가르침의 일부 내용이다. < 저자 세이노 >
경영서적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개하는 책,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다 보니 IT 환경을 지적한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세이노님이 작성한 글 내용에서 대형 커머스 시스템을 이용하며 불편했던 상황을 잘 지적하였는데 정확히 맞는 말이다. 대형 커머스를 수행하는 SI 업체는 몇 군데 SI 업체에서 나눠 먹는 시장이라도 봐도 무방하다. 개발 소스도 대부분 비슷하고 지저분하다. 디자인은 바뀌어도 코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SI 기업 내부에는 사업 수행 시 TO 가 많이 없는 UI 전문 인력을 고용할 필요도 없다. 간혹 UI 이슈가 있는 경우 재하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마저도 SI 업체의 이익율 때문에 소싱 회사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프리랜서를 급하게 고용해 투입하기 때문에 세심하고 편의성 높은 UI를 고려하기 어렵다.
S* 기업 등 일부 대기업 내부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UX/UI 전문 인력과 교육팀을 구성해 운영중이며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 성과도 좋으며 사용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앞서 세이노님의 지적과 같이 대부분의 기업, 특히 공공기관 시스템은 사용자 만족도 보다는 기존 영업 담당자를 더 챙기는 것 같다.